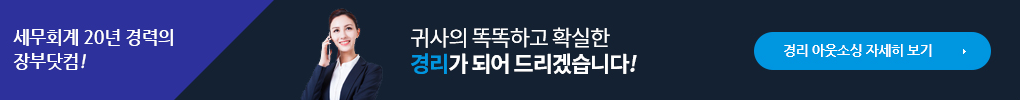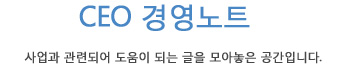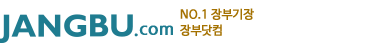아저씨! 사과 한 개도 팔아요?
페이지 정보
조회1,484회본문
< 아저씨! 사과 한 개도 팔아요? >
15년 전으로 기억한다.
나는 관악구에 있는 세평 정도의
낡고 오랜 된 반지하 원룸에 살았었다.
원룸은 지하철에서 20분 이상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렇지만 월세가
20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낡고 좁은 반지하 원룸이지만,
나에게는 전에 살던 고시원에 비하면
호텔처럼 느껴졌다.
시월 중순.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날,
고된 하루 일을 끝내고 지하철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다.
마을버스가 있었지만,
차비를 아끼려고 먼 거리를 걸어 다녔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먹거리가 많았다.
분식집, 족발집, 과일가게, 치킨집, 피자집,
만둣집 등이 나를 유혹했다.
그 당시 삼시 세끼를 때우는 것도
버거웠기에 먹거리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지하철역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오래된 동네라서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골목도 좁아서 밤길은 항상 긴장해야 했다.
오르막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래되고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 가판대에는 과일도 팔았다.
시월 늦가을.
구멍가게 가판대에는
빨간 사과가 놓여 있었다.
열 개 정도 담겨있는 바구니에
3천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입에 침이 고였다. 먹고 싶었다.
그러나 내 상황은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3천 원을 과일 사는데 쓰는 건 사치였다.
사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가게 아저씨는 나에게 말했다.
"사과 드릴까요?"
"아저씨! 사과 한 개씩도 팔어요?"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다.
"아. 네 한 개도 팔아요"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원래는 400원인데, 300원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사과 두 개만 주세요"
구멍가게 아저씨는 마치
내 주머니 사정을 잘 아는 듯했다.
나는 사과 두 개를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원룸으로 걸어갔다.
저녁은 일터에서 먹고 왔는데도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항상 배가 고팠다.
사과를 깨끗이 닦고, 반으로 잘랐다.
비닐봉지에 반개를 정성스럽게 담았다.
껍질은 깍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과 껍질만으로도
배를 채우고 싶었다.
사과를 작게 한입 베어 물었다.
입안을 타고 온몸으로 사과의 단맛과
신맛이 동시에 온몸으로 번져갔다.
그렇게 조금씩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다.
중간에 있는 씨와 몸통까지
모두 남김없이 먹었다.
참 행복했다.
한주가 지나고, 다시 골목길을 걸어갔다.
다시 구멍가게 앞에서 섰다.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서,
두 개를 살 요량이었다.
"아저씨 사과 두 개만 주세요"
"네. 그래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끼어들면서 말했다.
"아저씨. 사과 한 바구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는 나보다 나중에 온
아주머니에게 먼저 계산했다.
나는 순간 화가 났다.
"많이 사는 아주머니를 우대하나?"
"나는 2개 밖에 안 산다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아주머니가 가면 따지려고 했는데,
아저씨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큰 사과 박스를
끙끙거리며 힘들게 들고 나왔다.
아저씨는 박스를 열고 불빛 아래서
신중하게 사과를 하나씩 보면서
두 개를 골라서 봉지에 싸주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과인데,
여기 가판대 있는 거보다 더 크고 맛있어요"
나는 그때야 알았다.
아저씨가 나보다 늦게 온 아주머니를
먼저 계산해 준 이유를.
집으로 돌아와서
사과 반쪽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다.
힘든 나를 배려해 주는
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 이후로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과 2개를 사들고 집으로 갔다.
두 달 정도 뒤에
구멍가게를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저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음 해 봄이 왔다.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가는데, 멀리 구멍가게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어~. 아저씨가 다시 나오셨나?"
나는 구멍가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예전처럼 그때 그 자리에
앉아계셨다. 너무나 반가웠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불빛 아래에서 보이는
아저씨의 얼굴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
그사이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에 혈색이 없어 보였다.
아저씨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왔었던 터라,
돈도 못 벌고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
그날 나는 형편상
사과를 2개 사고 싶었지만,
아저씨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아저씨, 사과 한 바구니 주세요."
"두 개만 살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형편이 좀 좋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잘 되셨네요."
아저씨는 예전처럼
바구니에 있는 사과가 아닌,
박스에서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좋은 걸로만 10개를 담아 주셨다.
서로가 말을 안 했지만
나도 아저씨의 마음을
아저씨도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날 먹었던 사과는 유난히 더 맛있었다.
얼마 전,
예전에 살았던 원룸 부근을 지나갔다.
순간 내가 살던
구멍가게 아저씨가 생각났다.
나는 차를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항상 내가 걸어갔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다.
예전보다 새집도 많아지고,
가로등도 많아졌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예전에 그 구멍가게에서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한껏 기대를 하고
골목길 코너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구멍가게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신축빌라가 지어져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힘들었지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때 구멍가게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어려웠던 시절.
아저씨의 작은 관심과 배려 덕에
견뎌낼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이
눈물겹게 그립다.
"아저씨!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출처 : 단희캠퍼스